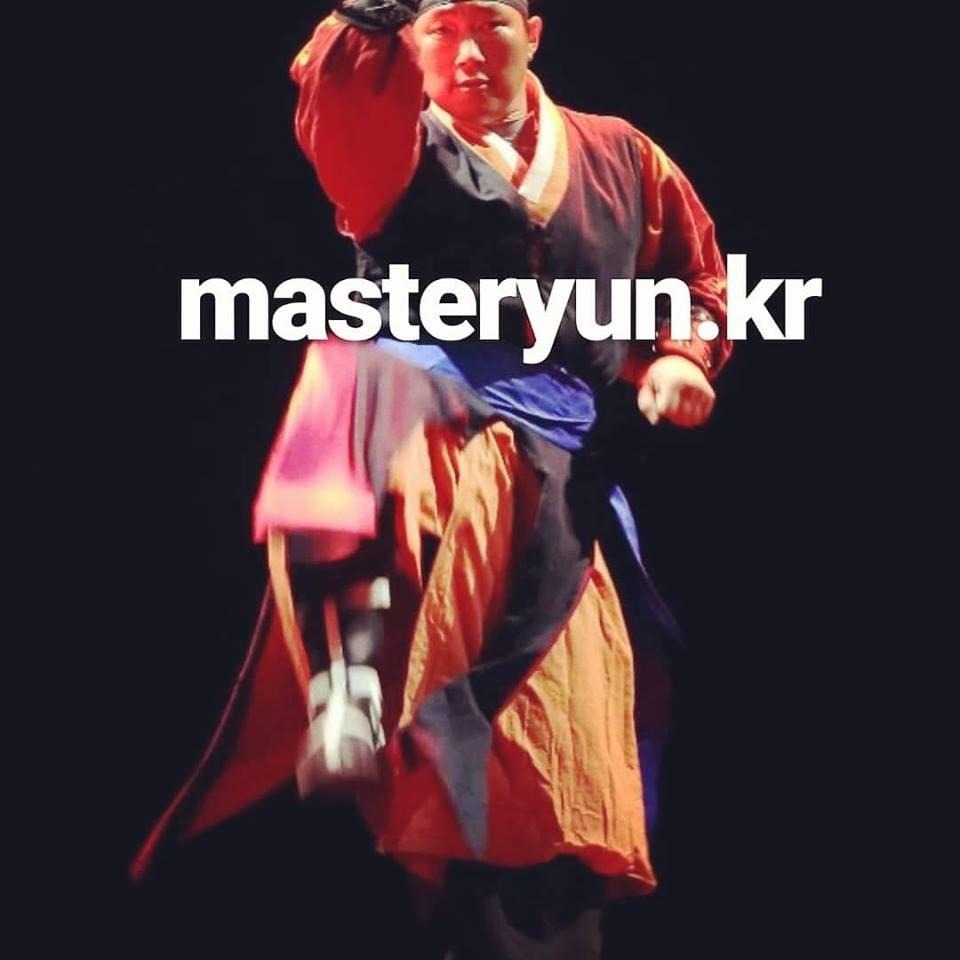이번 월요일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지인들과 모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남미에서 14년간 살아온 내가 중남미 역사에 대해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석연찮은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믿을만한 자료들을 찾아 비교한 뒤
그 중 분략이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취하여 표현 등을 조금 수정하고 여기에 옮겨놓았다.
중남미의 간략한 역사
1492년 8월 3일 스페인의 페르난도와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업고 바다 너머에 있을 인도를 찾아 출항한 콜롬부스는 석 달의 항해 끝에 10월 12일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있는 바하마 군도의 한 섬에 도착한다. 그는 이 섬을 산살바도르(San Salvador)라 명명하였고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디딘 사람이 된다. 이날은 오늘날에 인종의 날(Dia de la Raza)이라는 국경일로서 스페인과 전 아메리카 대륙의 기념일이 되었다. 콜롬부스 이후 바스코 누네아 데 발보아, 아메리고 베스푸치, 마젤란(Magallanes) 등의 모험가가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콜롬부스는 죽을 때까지 그가 발견한 이 대륙의 일부가 인도가 아닌 미지의 대륙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항해의 시기가 끝나자 그 뒤를 이어 들어온 것은 이 신대륙에 있을 황금에 눈먼 정복자들이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은 제국을 이루고 살던 원주민들을 무시하는 유럽인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1519년 멕시코 만의 베라크루스에 닻을 내린 코르테스(Hernan Cortes)가 1521년 아스떼까(Azteca)의 황제 목떼수마(Moctezuma)를 죽이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필두로 남미에서는 피사로(Francisco Pizzaro)와 알마그로(Diego de Almagro) 두 군인과 두께(Hernando Duque)라는 신부에 의해 잉까(Inca) 제국도 정복되었다. 이들은 1523년 11월 황제 아따우알빠(Atahualpa)를 인질로 붙잡고, 1535년 오늘날 페루(Peru)의 리마(Lima)인 시우닫 데 로스 레이예스(Ciudad de los Reyes)를 세우며, 1537년 마지막 잉까 황제인 망꼬 까빡(Manco Capac)을 죽이고, 1572년 잉까의 마지막 왕족인 투팍 아마루(Tupac Amaru)의 저항을 그를 죽임으로써 잉까를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1536년 콜롬비아에 보고따를 건설하고 칩차 족을 멸망시키고 중미에서는 1545년 마야를 정복하였고 1560년 카라카스 시를 그리고 칠레 정복자인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를 이어 1540년 산티아고 시를 차례로 건설하며 1560년대를 끝으로 약 50년 사이에 중남미의 대 제국들은 어이없이 무너지면서 스페인은 이를 모두 평정하고 식민지의 기초를 다진다. 새 스페인 영으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북미, 서인도 제도를 세우고, 새 까스띠야 영으로 페루, 칠레를 그리고 새 그라나다 영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세운다. 멕시코,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은광을 발견하여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이들 나라 중에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세 나라를 라 쁠라따(la plata, 은)라고 부른다.
멕시코의 아스떼까나 페루의 잉까 제국 모두 통치자를 먼저 처형함으로써 적은 수의 군사로 정복이 용이할 수 있었다고 할만큼 신정 일치의 황제 정치 체제를 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르네상스를 지나며 발전의 가속이 붙었던 스페인 군대의 기술적 우위 즉 갑옷, 말, 대포, 보병, 총 등의 신무기의 위력과 아스떼까나 잉까 제국의 내분도 그 원인이 된다.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은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백인들이 들여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 구대륙의 질병들이 신대륙 원주민들의 생명을 파도처럼 쓸어가 버렸다. 콜롬부스가 첫발을 내디딜 당시만 해도 아스떼까 제국은 인구가 약 500만 또는 600만을 헤아리고 중남미 전체에 5천만 명에서 약 1억까지 추정되던 원주민들이 정복된 지 1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 수가 90%나 격감하였다. 질병의 원인도 있지만 금, 은 광산에서의 강제 노역과 노동력 착취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과 흑인 노예 유입 등도 그 원인이다. 유럽은 중남미 수탈의 결과로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강국이 되었다.
약 300여 년간 수탈을 당하던 중남미에 독립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스페인 본국 태생 즉 뻬닌술라르(peninsular, 반도인)가 아닌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 지배층 즉 끄리오요(criollo) 들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스페인으로부터의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분리되는 독립전쟁은 1810년 멕시코에서 시작되었으며 1824년 페루의 아야꾸쵸 전투를 끝으로 25년만에 24개국이 독립을 달성한다. 약 15년간에 걸친 독립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1807년 나폴레옹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침입함으로서 야기된 혼란이다. 그러나 그밖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끄리오요 지식인들의 본토인에 대한 저항은 수탈 위주로 자행된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 정책과 자유무역을 추구한 영국의 꼬드김 그리고 끄리오요들의 시의회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지만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1810년 7월 베네수엘라의 끄리오요인 미란다 장군은 베네수엘라 독립을 선포하여 독립 전쟁의 불을 놓지만 실패한다. 그 휘하의 부하였던 끄리오요 출신의 볼리바르(Simon Bolivar)가 그 뒤를 이어 1812년 제 2차 독립 전쟁을 일으킨다. 이로부터 14년에 걸쳐 중남미의 독립 전쟁이 벌어져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중남미 독립 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남미 독립의 아버지'인 볼리바르는 타협을 하지 않는 인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미 북부 지역의 독립을 주도했다. 지금도 그가 독립시킨 나라들의 도시에 가면 그의 동상이 있다. 1811년 남미 최초로 베네수엘라를 독립시킨 후 1819년 보야까(Boyaca)에서 콜롬비아를 해방시킨 후 대 콜롬비아 연방 건설 대통령을 역임한다. 그의 이상인 북미처럼 남미 합중국을 꿈꾸었던 것이다. 1821년 볼리바르 휘하의 수끄레(Sucre) 장군이 까라보보(Carabobo)에서 에콰도르를 독립시키고 같은 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묶어서 그란 콜롬비아를 탄생시킨다.
이에 남미 남부를 해방시키며 올라온 산 마르띤(Jose de San Martin) 장군은 1818년 오히긴스(Bernado O'Higgins) 장군과 함께 칠레를 해방시킨다. 이후 오히긴스는 칠레 초대 대통령에 오르지만 군사 독재를 펼친다. 그는 1821년 7월 페루의 독립을 선언한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남부를 해방시킨 산 마르띤은 현실주의자로서 1822년 7월 26일과 27일 페루 해방을 놓고 에콰도르의 과야낄 항구에서 남미를 단일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이상주의자 볼리바르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밀담을 나눈 뒤 볼리바르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독립 전쟁에서 물러난다. 1824년 볼리바르는 페루의 아야꾸초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페루와 볼리비아를 해방시킨다. 이후 1825년 상부 페루는 볼리비아(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로 독립함으로써 독립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러나 독립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볼리바르는 정치인으로서는 실패를 하고 1830년 그의 은퇴와 함께 그가 꾸었던 남미 합중국의 꿈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독립 이후 중남미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볼리바르가 꿈꾸었던 중남미 단일 공동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중남미 신생 독립국들은 정치적인 후진성을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안정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특출한 개인과 소집단의 독립이 나타났으며 까우디요(caudillo)라는 새로운 군인 수령이 나타나 무력으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아이티라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독립국이다. 아이티 흑인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신생 독립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끄리오요 출신으로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 전쟁을 벌인 관계로 나머지 사회적 경제적인 방면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었다. 이것이 중남미가 북미 합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독립하였지만 현저히 낙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19세기는 북미가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실험실이 된 것에 비해 중남미는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조건이 다르다. 남북으로 뻗은 험한 안데스 산맥과 인적 미답의 아마존 밀림 게다가 끝없는 불모의 사막 등 자연 지형의 장애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외국 자본의 먹이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미 멕시코에는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 이달고(Hidalgo) 신부와 모렐로스(Morelos) 신부 등이 있다.
이후 근대사에 접어들며 절대 지도자 또는 수령이라는 뜻의 까우디요 즉 독재자의 시대가 펼쳐지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도가니에 접어든다. 이후 군장성과 각 지방의 토호인 까우디요들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힘센 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인 까우디이스모(Caudillismo)가 중남미의 고질적인 정치 파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남미 정치의 전형인 군벌 독재는 식민지 제도의 유물인 대지주제도의 영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의 빠에스, 블랑꼬, 아르헨티나의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와 1946년부터 9년간 독재 정치를 편 페론 대통령, 멕시코의 산타 아나, 고메스 대통령, 브라질의 바르가스 대통령, 쿠바의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대통령, 과테말라의 까브레라(Rafael Cabrera), 에콰도르의 모레노(Gabriel Garcia Moreno), 도미니카의 뜨루히요 대통령, 아이티의 두발리에, 니카라과의 소모사 부자 등으로 이들은 중남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주범들이기도 하다.